비서와 나2
ㅎㅍㄹ초ㅠ
2025-12-03 15:30
1,677
1
0
본문
제주, 5년 뒤
나는 지금 52살, 서울에선 이름도 못 꺼내는 ‘전 대표’다. 회사는 완전히 넘어갔고, 아내는 재혼해서 미국에 산다. 남은 거라곤 매달 들어오는 소액의 퇴직연금과, 지갑 속에 접혀서 반쯤 찢어진 초음파 사진 한 장뿐이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서진이를 찾지 않았다.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히 본 SNS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제주 서귀포, 작은 카페 ‘바당위’라는 곳.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옆에 네 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내 눈을 그대로 닮은.
그날 밤,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제주공항에 내린 건 11월 말, 바람이 뼈를 때릴 만큼 차가웠다. 카페는 대정읍, 한적한 마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히노끼 냄새와 함께 그녀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진이는 살이 조금 붙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왔네요.”
아이를 재운 뒤, 카페 문을 닫고 우리 둘만 남았다. 그녀는 따뜻한 귤차를 내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윤이에요. 이재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밤마다 울면서 젖 먹였어요. 대표님… 아니, 아저씨 얼굴이 생각하면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빌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만 울어요. 재윤이가 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녀의 체온이었다.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사실… 한 번도 미워해본 적 없어요. 그냥… 아파서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카페 2층 그녀의 작은 방에서 잤다. 재윤이는 옆방에서 천사처럼 코를 골았고, 서진이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이가 눈을 뜨자마자 내게 달려왔다. “아저씨! 엄마가 아빠라고 했어요!”
나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 서진이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늦지 않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울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카페도 작지만, 우리 셋이면 충분하니까.”
지금 나는 ‘바당위’의 공동대표다. 아침엔 재윤이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고, 서진이와 나란 손잡고 해변을 걷는다. 저녁이면 셋이서 밥을 먹고, 재윤이가 잠든 뒤엔 5년 전처럼 서로를 안는다.
가끔 서진이가 내 귀에 속삭인다. “그때… 도망쳤으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는다.
47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52살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제주 바다처럼, 늦게 와서 더 깊고 푸른 사랑으로.
나는 지금 52살, 서울에선 이름도 못 꺼내는 ‘전 대표’다. 회사는 완전히 넘어갔고, 아내는 재혼해서 미국에 산다. 남은 거라곤 매달 들어오는 소액의 퇴직연금과, 지갑 속에 접혀서 반쯤 찢어진 초음파 사진 한 장뿐이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서진이를 찾지 않았다.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히 본 SNS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제주 서귀포, 작은 카페 ‘바당위’라는 곳.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옆에 네 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내 눈을 그대로 닮은.
그날 밤,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제주공항에 내린 건 11월 말, 바람이 뼈를 때릴 만큼 차가웠다. 카페는 대정읍, 한적한 마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히노끼 냄새와 함께 그녀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진이는 살이 조금 붙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왔네요.”
아이를 재운 뒤, 카페 문을 닫고 우리 둘만 남았다. 그녀는 따뜻한 귤차를 내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윤이에요. 이재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밤마다 울면서 젖 먹였어요. 대표님… 아니, 아저씨 얼굴이 생각하면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빌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만 울어요. 재윤이가 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녀의 체온이었다.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사실… 한 번도 미워해본 적 없어요. 그냥… 아파서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카페 2층 그녀의 작은 방에서 잤다. 재윤이는 옆방에서 천사처럼 코를 골았고, 서진이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이가 눈을 뜨자마자 내게 달려왔다. “아저씨! 엄마가 아빠라고 했어요!”
나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 서진이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늦지 않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울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카페도 작지만, 우리 셋이면 충분하니까.”
지금 나는 ‘바당위’의 공동대표다. 아침엔 재윤이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고, 서진이와 나란 손잡고 해변을 걷는다. 저녁이면 셋이서 밥을 먹고, 재윤이가 잠든 뒤엔 5년 전처럼 서로를 안는다.
가끔 서진이가 내 귀에 속삭인다. “그때… 도망쳤으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는다.
47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52살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제주 바다처럼, 늦게 와서 더 깊고 푸른 사랑으로.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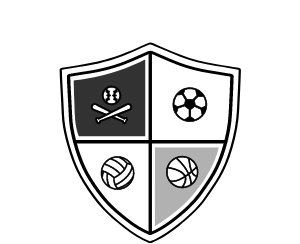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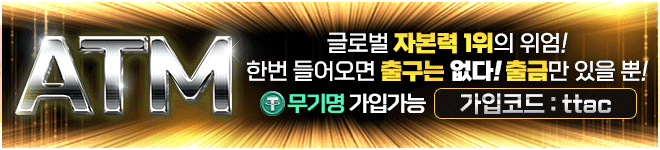




댓글목록1
나의빗자루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