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치녀
ㅎㅍㄹ초ㅠ
2025-12-03 15:36
2,391
1
0
본문
지하철 9호선, 급행 막차 안
나는 38살, 김포에서 강남까지 9호선 급행으로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다. 매일 밤 11시 47분 당산행 막차를 탄다. 그날도 평소처럼 맨 끝 칸, 맨 끝 좌석에 앉아 이어폰만 꽂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출발하자마자,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검정 트렌치코트에 하이힐,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어서 입술에 살짝 취한 입술이 보였다. 다리가 길어서 코트가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가 있었다. 검정 스타킹에 살짝 올라온 가터벨트 레이스가 보일락 말락 했다.
노량진 넘어서면서 차장이 불을 반쯤 껐다. 칸 안에 사람 넷뿐.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혼자세요?”
목소리가 낮고 술기운이 묻어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저도 혼자고… 심심해서.”
당산 3분 전.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다음 역에서 내릴 거예요. 같이 내릴래요?”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당산역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역 뒤편 24시간 무인 모텔. 카드가 찍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코트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블랙 슬립 하나뿐이었다.
“이름은 필요 없죠?”
그녀가 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코트 아래로 드러난 가슴이 내 손에 꽉 잡혔다. 젖꼭지가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더니 지퍼를 내렸다. “와… 진짜 크네.” 마스크는 여전히 턱에 걸린 채로 내 것을 끝까지 삼켰다. 혀끝이 밑을 핥을 때마다 허리가 저절로 들썩였다.
5분도 안 돼서 나는 그녀 입 안에 쏟아버렸다. 그녀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삼키더니 웃으며 일어났다. “이제 내 차례.”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벌렸다. 팬티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스타킹만 찢고 손가락 두 개를 넣자 그녀가 천장을 보며 신음했다. “아… 거기… 더 깊이…”
내가 들어가자 그녀가 다리를 내 허리에 감았다. “세게 해줘요…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
나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침대 머리판이 벽을 쿵쿵 때렸다. 그녀가 절정에 이를 때, 내 목을 깨물며 속삭였다. “나…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로.”
나도 더 참지 못하고 안에다 쏟았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녀가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20분… 막차 끊겼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자요.”
새벽 4시쯤, 그녀가 다시 올라탔다. 이번엔 조명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이름 알려줘도 돼요?”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민수야.” “나는 은지. 기억해줘.”
아침 6시. 그녀는 먼저 일어나 샤워하고 코트를 걸치더니 내 볼에 입 맞췄다. “또 막차 타요. 그때 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침대엔 그녀 향수 냄새와 내 몸에 남은 손톱자국만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9호선 급행 막차를 평생 놓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38살, 김포에서 강남까지 9호선 급행으로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다. 매일 밤 11시 47분 당산행 막차를 탄다. 그날도 평소처럼 맨 끝 칸, 맨 끝 좌석에 앉아 이어폰만 꽂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출발하자마자,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검정 트렌치코트에 하이힐,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어서 입술에 살짝 취한 입술이 보였다. 다리가 길어서 코트가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가 있었다. 검정 스타킹에 살짝 올라온 가터벨트 레이스가 보일락 말락 했다.
노량진 넘어서면서 차장이 불을 반쯤 껐다. 칸 안에 사람 넷뿐.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혼자세요?”
목소리가 낮고 술기운이 묻어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저도 혼자고… 심심해서.”
당산 3분 전.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다음 역에서 내릴 거예요. 같이 내릴래요?”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당산역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역 뒤편 24시간 무인 모텔. 카드가 찍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코트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블랙 슬립 하나뿐이었다.
“이름은 필요 없죠?”
그녀가 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코트 아래로 드러난 가슴이 내 손에 꽉 잡혔다. 젖꼭지가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더니 지퍼를 내렸다. “와… 진짜 크네.” 마스크는 여전히 턱에 걸린 채로 내 것을 끝까지 삼켰다. 혀끝이 밑을 핥을 때마다 허리가 저절로 들썩였다.
5분도 안 돼서 나는 그녀 입 안에 쏟아버렸다. 그녀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삼키더니 웃으며 일어났다. “이제 내 차례.”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벌렸다. 팬티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스타킹만 찢고 손가락 두 개를 넣자 그녀가 천장을 보며 신음했다. “아… 거기… 더 깊이…”
내가 들어가자 그녀가 다리를 내 허리에 감았다. “세게 해줘요…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
나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침대 머리판이 벽을 쿵쿵 때렸다. 그녀가 절정에 이를 때, 내 목을 깨물며 속삭였다. “나…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로.”
나도 더 참지 못하고 안에다 쏟았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녀가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20분… 막차 끊겼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자요.”
새벽 4시쯤, 그녀가 다시 올라탔다. 이번엔 조명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이름 알려줘도 돼요?”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민수야.” “나는 은지. 기억해줘.”
아침 6시. 그녀는 먼저 일어나 샤워하고 코트를 걸치더니 내 볼에 입 맞췄다. “또 막차 타요. 그때 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침대엔 그녀 향수 냄새와 내 몸에 남은 손톱자국만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9호선 급행 막차를 평생 놓치지 않기로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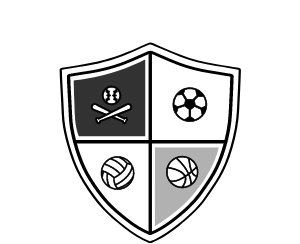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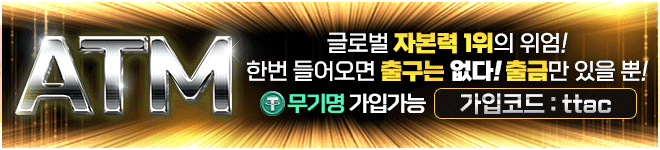




댓글목록1
나의빗자루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