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민폐남녀 외전
ㅎㅍㄹ초ㅠ
2025-12-03 15:40
1,778
1
0
본문
22층 옥상, 그리고 그 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금요일 10시 47분에 22층에서 만났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47초 안에 끝내는 게 룰이었다. 근데 그만, 딱 걸렸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절정 직전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쾅 열리고 평소에 무섭기로 유명한 혹부리 경비팀장 아저가 서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또 너희냐!”
CCTV로 계속 찝쩍대던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저씨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내가 이번엔 진짜 인사과에 올린다! 옷 벗고 나와!”
수연이는 팬티도 못 챙겨 입은 채로 스커트만 내리고, 나는 지퍼만 올린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끌려 나왔다. 아저씨가 무전기로 “22층 엘리베이터 이상, 즉시 차단”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난리였다.
다음 주 월요일. 인사과 소환, 경고장, 경비팀장은 우리 얼굴 보면 이를 갈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옮겼다.
새 장소: 옥상 비상계단 끝, 기계실 뒤
28층 옥상 문은 평소 잠겨 있지만, 내가 마케팅팀 행사 때 받은 마스터키가 있었다. 수요일 밤 10시 50분.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수연이 치마가 펄럭였다.
“여기선 CCTV 없지?” 수연이가 내 목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없어. 내가 다 확인했어.”
나는 그녀를 기계실 벽에 밀어붙였다. 바람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들킬까 봐 긴장해서인지 수연이 몸이 더 뜨거웠다.
블라우스 단추를 풀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자기 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은… 팬티 안 입고 왔어.”
진짜였다. 바람이 스치자마자 이미 축축한 게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 다리를 어깨에 올렸다. 옥상 바닥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수연이는 내 머리를 누르며 “아… 바람 불어서… 더 느껴져…” 하고 신음했다.
그녀가 먼저 절정에 이를 때 바람에 실려 서울 전체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그녀를 뒤로 돌려세웠다. 기계실 철문에 두 손을 짚게 하고 뒤에서 단번에 들어갔다.
“여기서… 하면… 진짜 들킬 수도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수연이는 엉덩이를 더 뒤로 뺀다.
나는 그녀 머리카락을 쥐고 서울 불빛을 배경으로 미친 듯이 움직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 치마가 펄럭이고 그 바람결에 그녀 신음이 흩날렸다.
“준혁아… 나 또 가… 아아아!”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 때 나도 더는 못 참고 깊이 박아 넣으며 안에다 쏟았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경비 순찰 라이트가 번쩍였다. 우리는 웃음이 터졌다.
그 후로 우리는 옥상 기계실 뒤가 정식 장소가 됐다.
겨울이 되자 더 추워져서 패딩을 벗어놓고 하는 게 기본이 됐다. 눈 올 때는 아예 눈 위에 패딩을 깔고 서로 체온으로만 버텼다.
어느 날, 수연이가 내 귀에 속삭였다. “경비 아저씨가 우리 때문에 혈압 올랐다더라. 이제 옥상도 위험할지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다음엔… 지하 3층 주차장 맨 끝자리로 가자.”
수연이가 내 목을 깨물며 말했다. “어디든… 너만 있으면 돼.”
그날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28층 옥상에서 우리는 또 47초가 아니라 47분을 서울 밤하늘 아래에서 보냈다.
경비 아저씨는 아직도 우리를 잡으려 혈안이지만, 우리는 계속 장소를 바꿔가며 회사 안 어디에서든 서로를 원한다.
이게 우리만의 진짜 ‘야근 수당’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금요일 10시 47분에 22층에서 만났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47초 안에 끝내는 게 룰이었다. 근데 그만, 딱 걸렸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절정 직전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쾅 열리고 평소에 무섭기로 유명한 혹부리 경비팀장 아저가 서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또 너희냐!”
CCTV로 계속 찝쩍대던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저씨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내가 이번엔 진짜 인사과에 올린다! 옷 벗고 나와!”
수연이는 팬티도 못 챙겨 입은 채로 스커트만 내리고, 나는 지퍼만 올린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끌려 나왔다. 아저씨가 무전기로 “22층 엘리베이터 이상, 즉시 차단”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난리였다.
다음 주 월요일. 인사과 소환, 경고장, 경비팀장은 우리 얼굴 보면 이를 갈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옮겼다.
새 장소: 옥상 비상계단 끝, 기계실 뒤
28층 옥상 문은 평소 잠겨 있지만, 내가 마케팅팀 행사 때 받은 마스터키가 있었다. 수요일 밤 10시 50분.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수연이 치마가 펄럭였다.
“여기선 CCTV 없지?” 수연이가 내 목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없어. 내가 다 확인했어.”
나는 그녀를 기계실 벽에 밀어붙였다. 바람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들킬까 봐 긴장해서인지 수연이 몸이 더 뜨거웠다.
블라우스 단추를 풀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자기 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은… 팬티 안 입고 왔어.”
진짜였다. 바람이 스치자마자 이미 축축한 게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 다리를 어깨에 올렸다. 옥상 바닥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수연이는 내 머리를 누르며 “아… 바람 불어서… 더 느껴져…” 하고 신음했다.
그녀가 먼저 절정에 이를 때 바람에 실려 서울 전체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그녀를 뒤로 돌려세웠다. 기계실 철문에 두 손을 짚게 하고 뒤에서 단번에 들어갔다.
“여기서… 하면… 진짜 들킬 수도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수연이는 엉덩이를 더 뒤로 뺀다.
나는 그녀 머리카락을 쥐고 서울 불빛을 배경으로 미친 듯이 움직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 치마가 펄럭이고 그 바람결에 그녀 신음이 흩날렸다.
“준혁아… 나 또 가… 아아아!”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 때 나도 더는 못 참고 깊이 박아 넣으며 안에다 쏟았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경비 순찰 라이트가 번쩍였다. 우리는 웃음이 터졌다.
그 후로 우리는 옥상 기계실 뒤가 정식 장소가 됐다.
겨울이 되자 더 추워져서 패딩을 벗어놓고 하는 게 기본이 됐다. 눈 올 때는 아예 눈 위에 패딩을 깔고 서로 체온으로만 버텼다.
어느 날, 수연이가 내 귀에 속삭였다. “경비 아저씨가 우리 때문에 혈압 올랐다더라. 이제 옥상도 위험할지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다음엔… 지하 3층 주차장 맨 끝자리로 가자.”
수연이가 내 목을 깨물며 말했다. “어디든… 너만 있으면 돼.”
그날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28층 옥상에서 우리는 또 47초가 아니라 47분을 서울 밤하늘 아래에서 보냈다.
경비 아저씨는 아직도 우리를 잡으려 혈안이지만, 우리는 계속 장소를 바꿔가며 회사 안 어디에서든 서로를 원한다.
이게 우리만의 진짜 ‘야근 수당’이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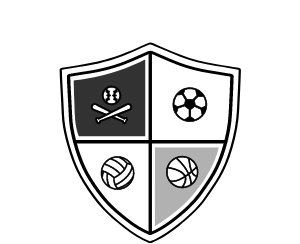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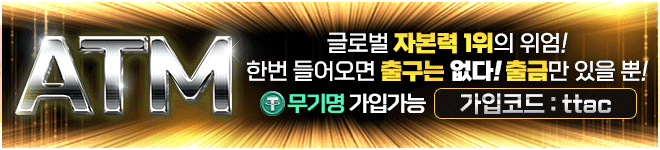




댓글목록1
나의빗자루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