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 온도
ㅎㅍㄹ초ㅠ
2025-12-06 00:12
1,783
1
0
본문
버스 정류장 유리창이 비에 젖어 흐려졌다.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버스 앞면에 비친 한 여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김서윤 선배였다.
졸업 후 3년.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지금 이 비 오는 거리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듯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한별아.”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과 목선을 따라 붙어 있었고 블라우스가 살짝 비쳐서 속살이 은은하게 비쳤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듯 걸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닿자 젖은 천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아찌그러졌다.
“추워?” 그녀가 물었다.
대답 대신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숨결이 셔츠를 뚫고 들어왔다.
그녀의 집은 정말 가까웠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내 뺨을 감싼 채 입술을 가져왔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나 곧 3년 동안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졌다.
나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내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허리를 비틀었다.
젖은 블라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아래로 드러난 어깨선이 빗물과 체온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손이 내 등 아래로 미끄러졌다. 손끝이 허리띠를 건드릴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선배… 정말 괜찮아?”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이끌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입술 위로 옮겨왔다.
우리는 서로를 삼키듯 키스했다. 혀끝이 닿을 때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살점 하나하나에 새겨지듯 되살아났다.
그녀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내 손 아래로 그녀의 몸이 뜨겁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내 귓불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다. “한별아… 더 세게 안아줘.”
나는 그녀의 허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다리로 내 허리를 감았다.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만 되뇌었다.
한별아. 서윤아.
그 이름이 살갗을 스칠 때마다 몸이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말 대신 몸으로 서로에게 3년을 돌려줬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욕정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건 오래 묻어뒀던 불씨가 마침내 터져 우리 둘을 모두 태워버린 필연이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김서윤 선배였다.
졸업 후 3년.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지금 이 비 오는 거리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듯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한별아.”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과 목선을 따라 붙어 있었고 블라우스가 살짝 비쳐서 속살이 은은하게 비쳤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듯 걸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닿자 젖은 천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아찌그러졌다.
“추워?” 그녀가 물었다.
대답 대신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숨결이 셔츠를 뚫고 들어왔다.
그녀의 집은 정말 가까웠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내 뺨을 감싼 채 입술을 가져왔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나 곧 3년 동안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졌다.
나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내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허리를 비틀었다.
젖은 블라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아래로 드러난 어깨선이 빗물과 체온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손이 내 등 아래로 미끄러졌다. 손끝이 허리띠를 건드릴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선배… 정말 괜찮아?”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이끌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입술 위로 옮겨왔다.
우리는 서로를 삼키듯 키스했다. 혀끝이 닿을 때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살점 하나하나에 새겨지듯 되살아났다.
그녀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내 손 아래로 그녀의 몸이 뜨겁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내 귓불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다. “한별아… 더 세게 안아줘.”
나는 그녀의 허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다리로 내 허리를 감았다.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만 되뇌었다.
한별아. 서윤아.
그 이름이 살갗을 스칠 때마다 몸이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말 대신 몸으로 서로에게 3년을 돌려줬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욕정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건 오래 묻어뒀던 불씨가 마침내 터져 우리 둘을 모두 태워버린 필연이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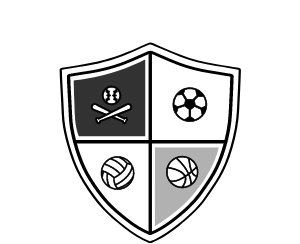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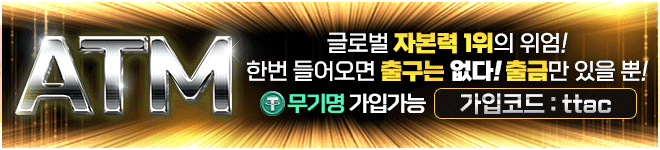




댓글목록1
해밀턴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