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의 끝에 느껴지는 느낌1
ㅎㅍㄹ초ㅠ
7시간 36분전
217
1
0
본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가을 밤이었다.
준호의 개인 미술실은 도시 외곽,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공간.
벽마다 그의 작품이 걸려 있었지만, 최근 6개월간 붓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림자’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화가, 35살.
그의 그림은 빛이 사라진 후 남은 윤곽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그를 삼키는 듯했다.
캔버스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 스케치가 떠오르지 않았다.
연인과의 이별 후, 모든 색이 바래버린 탓일까.
그녀의 그림자가 아직도 미술실 구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매일 밤, 빈 캔버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시 그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소연은 그 미술실의 조수였다. 28살,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준호의 작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그녀는 그의 그림에 매료되어 이 자리를 얻었다. 대학 시절 미술 전공을 포기한 후, 누드 모델로 비밀스레 일하며 몸으로 예술을 느꼈다. 준호의 ‘그림자’ 시리즈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저렸다. 그림 속 모델들의 윤곽이, 빛이 아닌 어둠으로 빛났다. ‘나도 저 안에 서고 싶어.’ 그 생각이 소연을 움직였다. 그녀는 조수 신청서에 ‘모델 가능’이라고 적었다. 준호는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할 때 부를게.” 그 한마디가 소연의 밤을 채웠다.
첫 모델 세션이 시작된 건 비 오는 그날 오후. 미술실 문을 열자, 준호가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소연은 가운을 벗고 포즈를 취했다. 누드. 그녀의 피부가 창가의 희미한 빛에 물들었다. 준호의 붓이 스케치북을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당신의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소연은 포즈를 유지하며 그를 봤다. 준호의 눈이 그녀의 어깨 윤곽을 따라 움직였다. 그 시선이 스치듯 피부를 스쳤다. 소연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왜지? 이건 그냥 세션인데.’ 하지만 그 시선에 담긴 게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준호의 손끝이 붓을 쥔 채 떨렸다. 그 떨림이 소연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준호는 왜 소연에게 끌렸을까. 첫째, 그녀의 윤곽이었다. 소연의 몸은 완벽한 비율이 아니었다. 어깨가 살짝 내리고, 허리가 부드럽게 굽는 그 불완전함이, 그의 그림자 시리즈와 맞아떨어졌다. 캔버스에 그릴 때, 그녀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일 것 같았다. 둘째, 침묵이었다. 소연은 포즈를 취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준호의 블록을 흔들었다. 그의 과거 연인처럼, 말로 채우지 않고 몸으로 존재하는 그 느낌. 셋째, 눈빛이었다. 소연의 눈이 포즈 중에도 그를 스쳤다. 호기심과 동경이 섞인 그 눈빛이, 준호의 텅 빈 마음에 색을 입혔다. 넷째, 그 기다림이었다. 소연이 세션 후 “다음엔 더 나아질게요”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의 여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붓을 쥐는 상상을 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소연이 가운을 걸치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내 그림자가… 도움이 됐나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소연의 윤곽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군요.”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다름’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왜 준호에게 빠졌을까. 첫째, 그의 손이었다. 붓을 쥔 그 손가락의 긴장감. 스케치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이, 그녀의 피부를 상상하며 움직이는 듯했다. 둘째, 시선의 깊이였다. 준호의 눈은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았다. 그 시선이 소연의 과거 상처 – 모델로 일하며 받은 시선의 무게 – 를 녹였다. 셋째, 블록의 고통이었다. 소연은 조수로 일하며 그의 고독을 봤다. 캔버스 앞에서 한숨 쉬는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그려줄 수 있을까.’ 넷째, 그 약속 같은 미소였다. 세션 끝에 “고마워”라고 할 때의 그 미소. 짧지만, 진심이 스며든 그 미소가 소연의 밤을 밝혀줬다.
정전이 일어난 건 세션이 끝난 직후였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미술실이 어둠에 잠겼다. 비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준호가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다. 스르륵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방을 채웠다. 소연의 몸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벽에 길게 늘어진 그 윤곽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세션은 끝났어요. 나가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문은 비 때문에 잠겼다. 열쇠가 문 쪽에 떨어져 있었다. 소연이 웃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림자예요.”
그녀가 포즈를 다시 취했다. 촛불 불빛 아래, 누드 몸이 은은하게 빛났다. 준호의 숨이 살짝 멎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집었다. 하지만 붓 대신 손을 뻗었다. 벽에 소연의 그림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손끝이 벽을 스치며 윤곽을 재현했다. 어깨의 곡선, 허리의 굽힘. 그 동작에 소연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다가왔다. 준호의 손에 스치듯.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손끝이 벽을 그리다, 그녀의 실제 어깨에 가까워졌다. 거리가 좁아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촛불이 깜빡였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의 몸에 겹쳐졌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살짝 떨렸다.
“그림자는… 만져야 살아요.”
소연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준호의 가슴을 스쳤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연인의 그림자가 사라진 그날처럼.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는 달랐다. 그림자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촛불이 다시 깜빡였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의 몸 전체를 감쌌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미술실을 채웠다.
소연은 그 미술실의 조수였다. 28살,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준호의 작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그녀는 그의 그림에 매료되어 이 자리를 얻었다. 대학 시절 미술 전공을 포기한 후, 누드 모델로 비밀스레 일하며 몸으로 예술을 느꼈다. 준호의 ‘그림자’ 시리즈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저렸다. 그림 속 모델들의 윤곽이, 빛이 아닌 어둠으로 빛났다. ‘나도 저 안에 서고 싶어.’ 그 생각이 소연을 움직였다. 그녀는 조수 신청서에 ‘모델 가능’이라고 적었다. 준호는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할 때 부를게.” 그 한마디가 소연의 밤을 채웠다.
첫 모델 세션이 시작된 건 비 오는 그날 오후. 미술실 문을 열자, 준호가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소연은 가운을 벗고 포즈를 취했다. 누드. 그녀의 피부가 창가의 희미한 빛에 물들었다. 준호의 붓이 스케치북을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당신의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소연은 포즈를 유지하며 그를 봤다. 준호의 눈이 그녀의 어깨 윤곽을 따라 움직였다. 그 시선이 스치듯 피부를 스쳤다. 소연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왜지? 이건 그냥 세션인데.’ 하지만 그 시선에 담긴 게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준호의 손끝이 붓을 쥔 채 떨렸다. 그 떨림이 소연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준호는 왜 소연에게 끌렸을까. 첫째, 그녀의 윤곽이었다. 소연의 몸은 완벽한 비율이 아니었다. 어깨가 살짝 내리고, 허리가 부드럽게 굽는 그 불완전함이, 그의 그림자 시리즈와 맞아떨어졌다. 캔버스에 그릴 때, 그녀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일 것 같았다. 둘째, 침묵이었다. 소연은 포즈를 취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준호의 블록을 흔들었다. 그의 과거 연인처럼, 말로 채우지 않고 몸으로 존재하는 그 느낌. 셋째, 눈빛이었다. 소연의 눈이 포즈 중에도 그를 스쳤다. 호기심과 동경이 섞인 그 눈빛이, 준호의 텅 빈 마음에 색을 입혔다. 넷째, 그 기다림이었다. 소연이 세션 후 “다음엔 더 나아질게요”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의 여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붓을 쥐는 상상을 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소연이 가운을 걸치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내 그림자가… 도움이 됐나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소연의 윤곽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군요.”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다름’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왜 준호에게 빠졌을까. 첫째, 그의 손이었다. 붓을 쥔 그 손가락의 긴장감. 스케치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이, 그녀의 피부를 상상하며 움직이는 듯했다. 둘째, 시선의 깊이였다. 준호의 눈은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았다. 그 시선이 소연의 과거 상처 – 모델로 일하며 받은 시선의 무게 – 를 녹였다. 셋째, 블록의 고통이었다. 소연은 조수로 일하며 그의 고독을 봤다. 캔버스 앞에서 한숨 쉬는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그려줄 수 있을까.’ 넷째, 그 약속 같은 미소였다. 세션 끝에 “고마워”라고 할 때의 그 미소. 짧지만, 진심이 스며든 그 미소가 소연의 밤을 밝혀줬다.
정전이 일어난 건 세션이 끝난 직후였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미술실이 어둠에 잠겼다. 비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준호가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다. 스르륵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방을 채웠다. 소연의 몸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벽에 길게 늘어진 그 윤곽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세션은 끝났어요. 나가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문은 비 때문에 잠겼다. 열쇠가 문 쪽에 떨어져 있었다. 소연이 웃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림자예요.”
그녀가 포즈를 다시 취했다. 촛불 불빛 아래, 누드 몸이 은은하게 빛났다. 준호의 숨이 살짝 멎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집었다. 하지만 붓 대신 손을 뻗었다. 벽에 소연의 그림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손끝이 벽을 스치며 윤곽을 재현했다. 어깨의 곡선, 허리의 굽힘. 그 동작에 소연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다가왔다. 준호의 손에 스치듯.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손끝이 벽을 그리다, 그녀의 실제 어깨에 가까워졌다. 거리가 좁아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촛불이 깜빡였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의 몸에 겹쳐졌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살짝 떨렸다.
“그림자는… 만져야 살아요.”
소연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준호의 가슴을 스쳤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연인의 그림자가 사라진 그날처럼.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는 달랐다. 그림자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촛불이 다시 깜빡였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의 몸 전체를 감쌌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미술실을 채웠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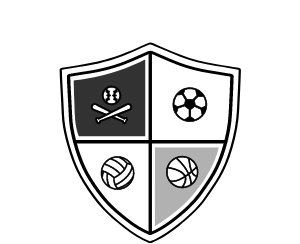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댓글목록1
Nicknick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