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의 끝에 느껴지는 느낌2
ㅎㅍㄹ초ㅠ
11시간 25분전
277
1
0
본문
촛불 불빛이 미술실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소연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준호의 몸에 겹쳐진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유일한 리듬.
준호의 손가락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윤곽을 따라 그은 선이, 이제 소연의 실제 어깨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니, 심장이 먼저 떨렸다.
가슴 안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울려 퍼졌다.
‘이건… 그림이 아니야.’
준호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탓이 오히려 그를 앞으로 밀어냈다.
소연의 그림자가 그를 부르는 듯,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소연은 포즈를 풀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도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준호의 손끝이 벽을 스치던 그 순간, 그녀의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등골이 서늘하게 저리며, 가슴이 터질 듯 팽창했다. 쿵, 쿵. 그 박동이 목까지 올라와 숨을 막았다. ‘왜 이렇게… 세게.’ 소연은 전에 느꼈던 그 시선을 떠올렸다. 준호의 눈이 그녀의 윤곽을 훑을 때, 이미 이 순간이 예감됐었다. 그 시선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손이 벽을 넘어 그녀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촛불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눈빛을 더 깊게 만들었다. “소연 씨… 이건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손은 이미 소연의 어깨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실제 피부에 닿을 듯 스쳤다. 아직 닿지 않았다. 그 거리, 손끝 하나만큼의 간격이 둘을 괴롭혔다. 준호의 심장이 그 간격을 메우려는 듯 더 세게 쿵쾅거렸다. 땀이 배어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 박동이 소연에게 전해질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전해지길 바랐다. ‘이 떨림을… 느껴줘.’
소연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녀의 눈이 준호를 마주쳤다. 촛불 불빛에 반사된 그 눈동자에, 준호의 그림자가 비쳤다. “캔버스가 아니에요. 당신 몸이.”
소연의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마침내 닿았다. 어깨 피부에.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이 폭발했다. 쿵! 가슴이 튀어 오를 듯 세게 한 번, 그리고 또 쿵! 그 리듬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와 숨을 가빠지게 했다. 준호의 손끝이 뜨거웠다. 그 열기가 피부를 따라 퍼지며, 그녀의 전신을 깨웠다. 소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끌었다. 자신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려보세요… 진짜로.”
준호의 손가락이 ‘붓질’처럼 움직였다. 소연의 등 곡선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동작에 그의 심장이 따라 춤췄다. 쿵쾅, 쿵쾅. 손끝이 그녀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그 박동이 더 강렬해졌다. 소연의 피부가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준호는 블록이 풀리는 걸 느꼈다. 6개월간 막힌 그 흐름이, 이제 그녀의 몸 위로 흘러나왔다. ‘이게… 영감이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창작이 아니었다. 소연의 숨결이 그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준호의 심장이 그 리듬을 따라 뛰었다. 동일한 박동. 서로의 심장이 공명하듯, 쿵쾅거렸다.
소연의 숨결이 촛불을 흔들었다. 불꽃이 살짝 춤추며 그림자를 뒤흔들었다. 소연의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준호의 몸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셔츠 위로.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 쿵! 하고 한 번 더 뛰었다. 소연의 손바닥 아래에서 그 박동이 느껴졌다. 강렬하게. 미친 듯이. “준호 씨… 당신 심장 소리, 들려요.”
소연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준호의 손이 멈췄다. 등 중앙에서. 그리고 천천히 올라갔다. 목덜미로. 손가락이 그녀의 잔머리를 쓸었다. 소연의 심장이 그 손길에 반응했다. 쿵쾅, 쿵쾅. 그 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게… 사랑인가.’ 소연은 조수로 일하며 준호의 고독을 봤었다. 캔버스 앞에서 손을 떨던 그를. 그 고독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길이 그 고독을 녹이고 있었다. 소연의 비밀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당신 작품 속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나.”
그 고백에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목덜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엄지가 그녀의 턱을 스쳤다. “소연 씨… 나도. 당신 그림자가 날 깨웠어요.”
준호의 블록이 완전히 풀렸다. 그의 손바닥이 소연의 등 전체를 덮었다. 그림자를 ‘그린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건 이미 붓질이 아니었다. 체온이 섞였다. 소연의 피부가 그의 손에 녹아들었다.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허리로 내려갔다. 허리 곡선을 따라. 소연의 심장이 그 선을 따라 쿵쾅거렸다. 준호의 손이 허벅지로 미끄러질 때, 그녀의 다리가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둘 다 알았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선이었다.
촛불이 깜빡였다. 불꽃이 꺼질 듯 흔들리며 그림자를 더 길게 만들었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를 완전히 감쌌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 그림자에 다가갔다. 아직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가, 심장의 박동만큼 좁아지고 있었다. 쿵쾅. 쿵쾅. 서로의 심장이 하나가 된 듯, 미술실 전체를 울렸다.
소연은 포즈를 풀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도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준호의 손끝이 벽을 스치던 그 순간, 그녀의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등골이 서늘하게 저리며, 가슴이 터질 듯 팽창했다. 쿵, 쿵. 그 박동이 목까지 올라와 숨을 막았다. ‘왜 이렇게… 세게.’ 소연은 전에 느꼈던 그 시선을 떠올렸다. 준호의 눈이 그녀의 윤곽을 훑을 때, 이미 이 순간이 예감됐었다. 그 시선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손이 벽을 넘어 그녀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촛불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눈빛을 더 깊게 만들었다. “소연 씨… 이건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손은 이미 소연의 어깨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실제 피부에 닿을 듯 스쳤다. 아직 닿지 않았다. 그 거리, 손끝 하나만큼의 간격이 둘을 괴롭혔다. 준호의 심장이 그 간격을 메우려는 듯 더 세게 쿵쾅거렸다. 땀이 배어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 박동이 소연에게 전해질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전해지길 바랐다. ‘이 떨림을… 느껴줘.’
소연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녀의 눈이 준호를 마주쳤다. 촛불 불빛에 반사된 그 눈동자에, 준호의 그림자가 비쳤다. “캔버스가 아니에요. 당신 몸이.”
소연의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마침내 닿았다. 어깨 피부에.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이 폭발했다. 쿵! 가슴이 튀어 오를 듯 세게 한 번, 그리고 또 쿵! 그 리듬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와 숨을 가빠지게 했다. 준호의 손끝이 뜨거웠다. 그 열기가 피부를 따라 퍼지며, 그녀의 전신을 깨웠다. 소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끌었다. 자신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려보세요… 진짜로.”
준호의 손가락이 ‘붓질’처럼 움직였다. 소연의 등 곡선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동작에 그의 심장이 따라 춤췄다. 쿵쾅, 쿵쾅. 손끝이 그녀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그 박동이 더 강렬해졌다. 소연의 피부가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준호는 블록이 풀리는 걸 느꼈다. 6개월간 막힌 그 흐름이, 이제 그녀의 몸 위로 흘러나왔다. ‘이게… 영감이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창작이 아니었다. 소연의 숨결이 그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준호의 심장이 그 리듬을 따라 뛰었다. 동일한 박동. 서로의 심장이 공명하듯, 쿵쾅거렸다.
소연의 숨결이 촛불을 흔들었다. 불꽃이 살짝 춤추며 그림자를 뒤흔들었다. 소연의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준호의 몸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셔츠 위로.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 쿵! 하고 한 번 더 뛰었다. 소연의 손바닥 아래에서 그 박동이 느껴졌다. 강렬하게. 미친 듯이. “준호 씨… 당신 심장 소리, 들려요.”
소연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준호의 손이 멈췄다. 등 중앙에서. 그리고 천천히 올라갔다. 목덜미로. 손가락이 그녀의 잔머리를 쓸었다. 소연의 심장이 그 손길에 반응했다. 쿵쾅, 쿵쾅. 그 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게… 사랑인가.’ 소연은 조수로 일하며 준호의 고독을 봤었다. 캔버스 앞에서 손을 떨던 그를. 그 고독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길이 그 고독을 녹이고 있었다. 소연의 비밀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당신 작품 속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나.”
그 고백에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목덜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엄지가 그녀의 턱을 스쳤다. “소연 씨… 나도. 당신 그림자가 날 깨웠어요.”
준호의 블록이 완전히 풀렸다. 그의 손바닥이 소연의 등 전체를 덮었다. 그림자를 ‘그린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건 이미 붓질이 아니었다. 체온이 섞였다. 소연의 피부가 그의 손에 녹아들었다.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허리로 내려갔다. 허리 곡선을 따라. 소연의 심장이 그 선을 따라 쿵쾅거렸다. 준호의 손이 허벅지로 미끄러질 때, 그녀의 다리가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둘 다 알았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선이었다.
촛불이 깜빡였다. 불꽃이 꺼질 듯 흔들리며 그림자를 더 길게 만들었다. 소연의 그림자가 준호를 완전히 감쌌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 그림자에 다가갔다. 아직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가, 심장의 박동만큼 좁아지고 있었다. 쿵쾅. 쿵쾅. 서로의 심장이 하나가 된 듯, 미술실 전체를 울렸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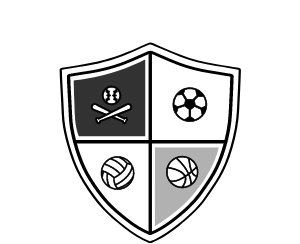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댓글목록1
Nicknick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