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벽 기차안에서5
ㅎㅍㄹ초ㅠ
20시간 8분전
202
1
0
본문
열차가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터널과 평야가 번갈아 스쳤다. 민준과 지은은 빈 객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완전히 친밀해진 두 사람. 지은이 민준의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민준아, 여기서 하면… 다른 승객 올지도 몰라. 위험해.” 그녀의 눈빛에 장난과 흥분이 섞였다.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게 더 짜릿하잖아, 지은아. 우리만의 비밀.” 그의 손이 원피스 같은 치마 안으로 미끄러졌다. 이미 젖은 속옷.
지은이 키스했다. 혀가 얽히며 뜨거운 숨결. “민준아, 나… 참을 수 없어.” 그녀가 블라우스를 벗었다. 브라가 풀리며 가슴이 드러났다. 분홍빛 유두, 민준의 입에 물렸다. “아앙…!” 지은의 신음이 객실을 울렸다. 민준의 혀가 핥고 빨았다. 손은 치마를 걷어 올렸다. 스타킹을 벗기며 맨다리를 어루만졌다. “지은아, 너무 예뻐. 네 몸이 다 내 거야.” 그는 속삭이며 팬티를 내리게 했다. 부드러운 음모, 습한 입구.
지은이 민준의 바지를 풀었다. 그의 성기가 튀어나왔다. 단단하고 뜨거운. “민준아, 커… 좋아.” 그녀가 손으로 문질렀다. 입으로 가져갔다. 혀가 핥아대며 빨아들였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누르며 신음했다. “지은아, 최고야… 아!” 구강 애무가 깊어졌다. 침이 흘러내리며 젖은 소리. 터널이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더 대담해졌다. 민준이 지은을 좌석에 눕혔다.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문질렀다. “들어갈게, 지은아.”
삽입. 천천히 미끄러지며 안으로. 지은의 안이 뜨겁고 좁았다. “아아… 민준아, 가득해!” 그녀가 허리를 들며 맞받았다. 민준이 움직였다. 천천히, 깊게. 피스톤 운동이 빨라졌다. 쿵쿵, 열차의 진동과 섞여. “사랑해, 지은아… 네 안이 너무 좋아.” 민준의 손이 가슴을 주무르며 유두를 꼬집었다. 지은의 신음이 커졌다. “민준아, 더 세게… 나 올 것 같아!” 그녀의 손톱이 등을 긁었다.
갑자기, 문 쪽에서 소리. 다른 승객이 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성기가 여전히 안에서 맥박쳤다. 어둠 속 긴장. 승객이 지나가고, 문이 닫혔다. “휴… 가까웠어.” 지은이 웃으며 민준을 끌어당겼다. 다시 움직임. 더 세게, 더 깊게. 터널 끝에서 빛이 스며들었다. 절정 직전. “지은아, 같이 가자!” 민준이 속삭였다. 지은의 몸이 떨렸다. “응… 민준아, 사랑해!” 오르가즘. 안으로 사정. 뜨거운 액체가 흘렀다.
두 사람은 헐떡이며 안겨 있었다. 지은이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준아, 이게 꿈이 아니야? 너무 강렬했어.”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지은아. 현실이야. 도착 전에… 약속해. 다시 만나자. 매일 이렇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민준아. 나도 사랑해. 영원히.” 마지막 키스. 열차가 부산역에 가까워졌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푸른 물결처럼, 두 사람의 사랑이 출발했다.
정차. 민준이 일어났다. 지은이 제복을 추슬렀다. “민준아, 내 번호. 문자해.” 그녀가 카드를 건넸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지은아, 오늘부터 시작이야.” 문이 열렸다. 승객들이 스멀스멀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열차가 떠나고, 민준은 플랫폼에 서서 지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벽의 첫 사랑, 영원할 터였다.
지은이 키스했다. 혀가 얽히며 뜨거운 숨결. “민준아, 나… 참을 수 없어.” 그녀가 블라우스를 벗었다. 브라가 풀리며 가슴이 드러났다. 분홍빛 유두, 민준의 입에 물렸다. “아앙…!” 지은의 신음이 객실을 울렸다. 민준의 혀가 핥고 빨았다. 손은 치마를 걷어 올렸다. 스타킹을 벗기며 맨다리를 어루만졌다. “지은아, 너무 예뻐. 네 몸이 다 내 거야.” 그는 속삭이며 팬티를 내리게 했다. 부드러운 음모, 습한 입구.
지은이 민준의 바지를 풀었다. 그의 성기가 튀어나왔다. 단단하고 뜨거운. “민준아, 커… 좋아.” 그녀가 손으로 문질렀다. 입으로 가져갔다. 혀가 핥아대며 빨아들였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누르며 신음했다. “지은아, 최고야… 아!” 구강 애무가 깊어졌다. 침이 흘러내리며 젖은 소리. 터널이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더 대담해졌다. 민준이 지은을 좌석에 눕혔다.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문질렀다. “들어갈게, 지은아.”
삽입. 천천히 미끄러지며 안으로. 지은의 안이 뜨겁고 좁았다. “아아… 민준아, 가득해!” 그녀가 허리를 들며 맞받았다. 민준이 움직였다. 천천히, 깊게. 피스톤 운동이 빨라졌다. 쿵쿵, 열차의 진동과 섞여. “사랑해, 지은아… 네 안이 너무 좋아.” 민준의 손이 가슴을 주무르며 유두를 꼬집었다. 지은의 신음이 커졌다. “민준아, 더 세게… 나 올 것 같아!” 그녀의 손톱이 등을 긁었다.
갑자기, 문 쪽에서 소리. 다른 승객이 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성기가 여전히 안에서 맥박쳤다. 어둠 속 긴장. 승객이 지나가고, 문이 닫혔다. “휴… 가까웠어.” 지은이 웃으며 민준을 끌어당겼다. 다시 움직임. 더 세게, 더 깊게. 터널 끝에서 빛이 스며들었다. 절정 직전. “지은아, 같이 가자!” 민준이 속삭였다. 지은의 몸이 떨렸다. “응… 민준아, 사랑해!” 오르가즘. 안으로 사정. 뜨거운 액체가 흘렀다.
두 사람은 헐떡이며 안겨 있었다. 지은이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준아, 이게 꿈이 아니야? 너무 강렬했어.”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지은아. 현실이야. 도착 전에… 약속해. 다시 만나자. 매일 이렇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민준아. 나도 사랑해. 영원히.” 마지막 키스. 열차가 부산역에 가까워졌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푸른 물결처럼, 두 사람의 사랑이 출발했다.
정차. 민준이 일어났다. 지은이 제복을 추슬렀다. “민준아, 내 번호. 문자해.” 그녀가 카드를 건넸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지은아, 오늘부터 시작이야.” 문이 열렸다. 승객들이 스멀스멀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열차가 떠나고, 민준은 플랫폼에 서서 지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벽의 첫 사랑, 영원할 터였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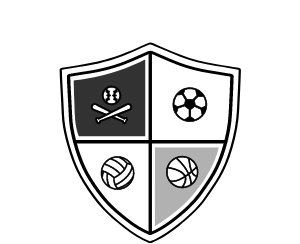







댓글목록1
루루랄제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